한국 영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한국 영화는 1901년 버튼 홈스가 한양의 풍경을 촬영하면서 시작되어, 1919년 김도산의 《의리적 구토》를 한국인이 제작하고 활용한 첫 사례로 한국 영화의 기원으로 여겨진다. 1923년 윤백남의 《월하의 맹서》는 최초의 극영화로, 같은 해 제작된 《춘향전》은 대중의 큰 인기를 얻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운규의 《아리랑》이 민족의 비애를 담아내어 한국 영화의 이정표로 평가받았다. 1930년대에는 발성 영화가 도입되었으나, 일제의 검열과 탄압으로 쇠퇴기를 겪었다. 광복 이후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 재건에 힘썼고, 1960년대에는 중흥기를 맞아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텔레비전 보급으로 불황을 겪었으나, 1980년대 영화법 개정으로 활기를 띠었다. 1990년대에는 한국 영화 부활을 모색했고, 2000년대 이후 《쉬리》, 《기생충》 등 다양한 영화들이 국내외에서 성공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북한 영화는 1947년 국립영화촬영소 설립으로 시작되어 체제 선전을 위한 영화가 주로 제작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한국의 영화 - 한국의 공포 영화
한국 공포 영화는 1960년대부터 발전하여 여성 귀신, 복수, 사회 비판 등의 특징을 가지며, 억압받던 여성의 원한과 사회 문제점을 반영하고, 안병기, 봉준호, 김지운 등의 감독과 《여고괴담》, 《장화, 홍련》 등의 작품을 통해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 대한민국의 영화 - 변사
변사는 무성영화 시대 한국과 일본에서 영화 상영 중 육성 해설을 통해 독자적인 영화미학과 문화를 구축한 직업이자 문화 현상으로, 한국 영화사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는다. - 대한민국의 영화 - 천만 관객 돌파 영화
천만 관객 돌파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를 의미하며, 2003년 《실미도》 이후 멀티플렉스 극장 확산과 함께 다양한 영화들이 천만 관객을 넘어서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고, 2024년 6월 기준 32편이 돌파했으며, 한국 영화 산업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했다. - 나라별 영화 - 오스트레일리아 영화
오스트레일리아 영화는 1890년대 시작되어 부침을 겪으며 1970년대 뉴웨이브를 통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정부 지원과 기술 발전, 다문화 사회 반영으로 성장하여 독자적인 영화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 나라별 영화 - 미국 영화
미국 영화는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사진과 토머스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에서 시작되어,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발전하며 무성 영화, 유성 영화 시대를 거쳐 다양한 장르 영화를 선보였다.
| 한국 영화 | |
|---|---|
| 지도 정보 | |
| 기본 정보 | |
 | |
| 스크린 수 | 2,424개 (2015년) |
| 배급사 | CJ엔터테인먼트 22% 쇼박스 17%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11% |
| 제작 연도 | 2015년 |
| 제작된 영화 수 | 269 |
| 관객 연도 | 2015년 |
| 총 관객 수 | 2억 1729만 명 |
| 자국 관객 수 | 1억 1293만 명 (52%) |
| 매출 연도 | 2015년 |
| 총 매출액 | 1조 7154억 원 |
| 자국 매출액 | 8796억 원 |
| 역사 | |
| 초기 영화 |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작 |
| 검열 | 한국 영화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 |
| 1980년대 | 영화 제작의 황금기 |
| 1990년대 후반 | 한국 영화 르네상스 |
| 2000년대 이후 |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영화 산업 성장 |
| 장르 및 특징 | |
| 다양한 장르 | 드라마, 코미디, 액션, 스릴러, 공포, 로맨스 등 |
| 사회적 메시지 | 한국 사회의 현실 반영 및 비판 |
| 독특한 스타일 | 한국적 특색을 살린 연출 방식 |
| 기술적 발전 | 특수효과 및 촬영 기술의 발달 |
| 주요 영화인 | |
| 감독 | 봉준호 박찬욱 김지운 이창동 |
| 배우 | 송강호 최민식 전도연 윤여정 |
| 기타 | 영화 제작자 촬영 감독 시나리오 작가 |
| 영화 산업 | |
| 제작 | 다양한 규모의 제작사 존재 |
| 투자 | 대기업 및 투자 펀드 참여 |
| 배급 | 대형 배급사 중심 |
| 상영 | 전국적인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 |
| 영화제 |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 정부 지원 | |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 산업 육성 및 지원 담당 |
| 정책 지원 | 제작비 지원,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 |
| 해외 진출 | |
| 국제 영화제 | 칸 영화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
| 글로벌 시장 |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국가 진출 OTT 플랫폼을 통한 해외 서비스 확대 |
| 과제 및 전망 | |
| 시장 경쟁 심화 | 국내외 영화 시장 경쟁 심화 |
| 불법 다운로드 | 불법 복제 및 유통 문제 |
| 창작 환경 개선 | 제작 환경 및 노동 조건 개선 필요 |
| 다양성 확보 | 다양한 소재 및 장르 개발 필요 |
| 미래 전망 | 세계 영화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기대 |
| 기타 | |
| 관련 정보 | 한국 영화 감독 목록 한국 영화 배우 목록 대한민국의 영화 |
2. 역사
한국 영화는 사회 근대화가 미숙했던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초창기 영화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족의 고뇌와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고자 했으며, 나운규와 같은 선구적인 영화인을 배출하기도 했다.[45]
한국에서의 최초 영화 상영 시점에 대해서는 1897년 서울 북촌 상영설[5] 등 여러 주장이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다.[6] 미국의 여행가 버턴 홈즈가 1899년 왕실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했다는 기록[8]과 1903년 동대문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상영회[5] 기록도 확인된다.
국내 최초의 영화관 역시 1907년 개관한 단성사라는 설과[9] 그보다 앞선 인천의 애관극장(옛 협률사)이라는 주장이 있다.[9] 초기 극장에서는 주로 유럽과 미국 영화가 수입되어 상영되었다.
한국인이 제작한 최초의 영화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1919년 상영된 키노드라마 《의리적 구토》가 최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10][11], 이 영화가 상영된 10월 27일은 영화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11][12][13] 한편, 최초의 장편 극영화로는 1922년 개봉된 《춘향전》[14] 또는 1923년 개봉된 윤백남 감독의 《월하의 맹서》[15][16]를 꼽기도 한다. 《춘향전》은 이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소재가 되었다.[14]
이처럼 한국 영화는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태동하여, 해방과 한국전쟁,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 과정,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발전해왔다.
2. 1. 1910~1920년대: 한국 영화의 태동과 민족 영화
조선 말엽 움직이는 사진인 활동사진이 들어오면서 한국 영화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01년 미국의 여행가 버튼 홈스가 한양의 풍경을 처음 촬영하였고, 청안군 이재순과 고종 황제에게 활동사진을 소개하며 조선 최초의 영화 상영회를 열었다.[40][7][8] 1903년 6월에는 동대문의 한성전기회사 창고에서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계 풍경 영화 상영회가 열렸는데, 설렁탕 한 그릇 값인 10전의 관람료에도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전해진다.[40][5] 1897년 중국인이 빌린 막사에서 프랑스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타임스 보도[5]나 1898년 남대문 근처 상영 기록도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다.[6]1910년 한일병합 이후, 1912년 북촌 종로통에 조선 최초의 상설 영화관인 우미관이 세워졌고, 1918년에는 박승필이 단성사를 인수하여 상설 영화관으로 개조하였다.[40] 단성사는 1907년 개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한국 최초의 영화관으로 널리 인식된다. (인천 애관극장이 1895년 협률사로 시작되어 더 오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9]) 초기 극장에서는 D. W. 그리피스의 《브로큰 블로섬스》(1919), 《웨이 다운 이스트》(1920), 더글러스 페어뱅크스 주연의 《로빈 후드》(1922) 등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된 영화가 상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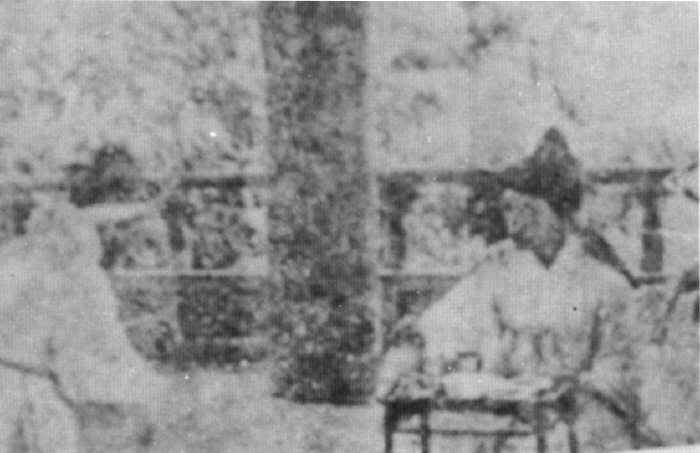
박승필은 외국 영화 상영에서 나아가 자체 영화 제작을 시도했다. 1919년 김도산의 신파극단과 함께 연극 무대와 영화 상영을 결합한 형태인 연쇄극 《의리적 구토》를 제작하였다. 이는 완전한 영화는 아니었지만, 한국인의 자본과 기술로 활동사진이 제작되고 활용된 첫 사례로 평가받는다.[40] 《의리적 구토》는 최초의 한국 영화로 여겨지며, 단성사에서 처음 상영된 10월 27일은 '영화의 날'로 기념되고 있다.[11][12][13] (같은 날 단성사에서는 다큐멘터리 《경성 전경》도 상영되었다.[10][11])

1923년 윤백남은 배우 이월화, 권일청과 함께 《월하의 맹서》를 감독했는데, 이는 전체가 영화 필름으로 제작된 최초의 한국 극영화로 평가된다.[15][16] (일부에서는 1922년 개봉된 《춘향전》을 최초의 장편 영화로 보기도 한다.[14]) 같은 해 동아문화협회 주도로 제작된 《춘향전》은 일본인 하야카와 마쓰지로(早川松次郞)가 감독하고 김조성, 김선초가 주연을 맡았지만, 무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시기에는 초기 한국 영화 개척자로 평가받는 안종화도 등장하여 《바다의 비곡》, 《운영전》 등에서 감독과 배우로 활동했다.
당시 영화는 소리가 없는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 내용을 설명하고 등장인물의 대사를 전달하는 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변사는 단순한 해설을 넘어 극의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때로는 영화의 흥행을 좌우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24] 특히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변사는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해 민족적인 설움이나 저항 의식을 대사에 담아 전달하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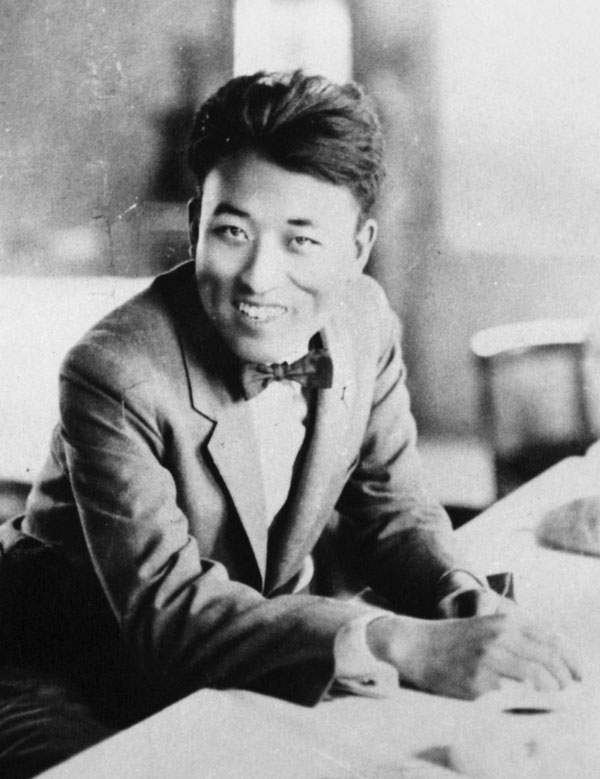
1925년에는 나운규가 영화계에 등장했다. 그는 감독, 배우, 시나리오 작가를 겸한 다재다능하고 창의적인 영화인이었다. 1926년 나운규가 직접 제작, 감독, 주연을 맡은 《아리랑》은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전설적인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제강점기하 우리 민족이 겪는 비애와 항거 정신을 인상적으로 담아내며 전국적으로 절대적인 환영을 받았다.[21] 《아리랑》의 성공은 한국 영화계에 큰 자극을 주어, 이후 많은 영화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 제작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고, 1927년 한 해에만 13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다.
《아리랑》 이후 1920년대 후반은 한국 무성 영화의 황금기로 불릴 만큼 영화 제작이 활발해져, 이 시기에만 70편 이상의 영화가 만들어졌다.[25] 나운규는 《풍운아》(1926), 《들쥐》(1927) 등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으며, 박승필과 함께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영화 제작을 목표로 '나운규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잘있거라》(1927), 《벙어리 삼룡이》(1929), 《사랑을 찾아서》(1929) 등을 제작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감독으로는 민족 계몽적인 내용을 담은 《먼동이 틀 때》(1927)를 연출한 심훈이 있다.[26]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영화 필름은 192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규설 감독의 문화영화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이다. 근로와 저축을 강조하는 내용이며, 감독 이규설은 《아리랑》에 출연했던 배우이기도 하다.[41]
한편, 1925년 독일인 사제 노베르트 베버는 일제 치하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국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이 영상을 편집하여 《임란데 데어 모르겐스틸레》(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아침 고요의 땅)라는 장편 다큐멘터리와 5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여 독일 등 유럽에서 상영하기도 했다.[17][18][19][20]
2. 2. 1930~1940년대: 발성 영화의 등장과 일제의 탄압
1931년 인도, 1932년 일본에서 발성 영화가 등장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성 영화 제작이 늦어졌다. 1934년 일본의 발성 영화가 조선에 처음 수입되면서 무성 영화 중심이던 조선 영화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45] 당시 발성 영화는 최첨단 기술이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영화인들은 힘을 모아 1935년 이명우 감독, 문예봉·한일송 주연의 《춘향전》을 제작하여 개봉했다. 이는 조선 최초의 발성 영화였다.[32] 음향 기술 등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 않았으나, 영화 속에서 우리말 대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45]
그러나 1936년 이후 군국주의 정책을 강화하던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의 영화 제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했고, 1937년부터 조선 영화는 다시금 침체기에 빠져들었다.[45] 특히 발성 영화의 등장은 영화 상영 시 내용을 해설하고 때로는 민족적인 메시지를 몰래 전달하기도 했던 변사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이는 일제가 영화 내용을 검열하고 통제하기 더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36]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강》(1938), 《수선화》(1940), 《무정(無情)》, 《수업료》, 그리고 인기 연극을 영화화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등 소수의 영화들이 1940년까지 명맥을 이어갔다.[45]
1941년부터 일제의 압력은 더욱 극심해져, 1942년에는 안석영 감독, 서월영·김일해 주연의 《흙에 산다》 단 한 편만이 제작될 정도로 조선 영화계는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르렀다.[45] 마침내 1943년, 총독부는 조선영화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영화 제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장악했다.[45] 이후 1945년 8.15 광복 이전까지 조선영화주식회사는 일본인 감독과 배우들을 동원하여 전쟁 미화나 내선일체를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영화만을 제작하도록 강요했다.[45] 이는 조선총독부 키네마 설립 등을 통해 영화를 식민 통치와 문화 동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일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33][34][35] 예를 들어, 한국인의 일본군 '자원' 입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너와 나》(1941)나 내선일체를 노골적으로 강조한 《望楼の決死隊|망루의 결사대일본어》(1943) 등이 이 시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친일 선전 영화이다.[35][37][38]
2. 3. 1945~1950년대: 해방과 전쟁, 그리고 재건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영화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영화 재건을 위해 노력했다. 광복 직후인 1946년과 1947년에는 주로 해방의 감격을 표현한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영화인들이 다시 모여 영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1946년 최인규 감독은 고려영화사(高麗映畵社)를 설립하고 《자유만세》를 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어서 이구영 감독의 《안중근 사기》, 윤봉춘 감독의 《윤봉길 의사》, 전창근 감독의 《해방된 내고향》, 이규환 감독의 《똘똘이의 모험》과 《3·1혁명기》, 김소동 감독의 《모란등기(牡丹燈記)》 등이 발표되었다.1947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유관순》, 신경균 감독의 《새로운 맹세》, 최인규 감독의 《죄없는 죄인》, 이규환 감독의 《갈매기》 등이 제작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맹세》는 배우 최은희의 데뷔작이기도 했다. 이듬해인 1948년에는 한형모 감독이 《성벽을 뚫고》를 발표하여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시기 영화들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인 면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으며, 민족의 고뇌와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42]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영화계는 다시 한번 큰 시련을 맞았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 제작은 계속되었다. 1952년 전창근 감독은 《낙동강》을, 이만흥 감독은 《애정산맥》을 발표했다. 같은 해 신상옥 감독이 《악야(惡夜)》로, 정창화 감독이 《최후의 유혹》으로 데뷔했다.
전쟁 후 1954년 서울로 돌아온 영화인들은 외국 영화의 유입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1954년에는 김성민 감독의 《북위 41도》, 윤봉춘 감독의 《고향의 노래》, 홍성기 감독의 《출격명령》, 신상옥 감독의 《코리아》 등이 제작되었다. 같은 해 '영화평론가협회상'과 한국 영화 초창기 공로자인 이금룡을 기리는 '금룡상'이 제정되어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에서는 배우 김진규가 데뷔했다.
1955년 5월, 국산 영화에 대한 면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한국 영화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 해 개봉한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은 당시 서울 개봉관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렸다. 1957년에는 최신 영화 기자재를 갖춘 안양촬영소가 준공되어 영화 제작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43]
2. 4.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중흥기
1954년부터 1970년까지의 중흥기 동안 제작된 한국 영화는 총 2,021편에 달하며, 이는 1919년 ~ 1945년 초창기의 166편, 1946년 ~ 1953년 과도기의 86편과 비교했을 때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준다. 1955년 이후 시행된 국산영화 면세 조치, 최신 영화 기자재 도입, 그리고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이 이러한 영화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43]특히 1960년대 초중반에는 청춘영화와 문예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배우 신성일은 이 시기 《맨발의 청춘》(1964), 《청춘교실》(1965), 《흑맥》(1965) 등 다수의 청춘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계에 스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43]
문예 영화 분야에서는 한국 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인 뛰어난 작품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김기영 감독의 《하녀》(1960), 신상옥 감독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1961),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1961), 김수용 감독의 《갯마을》(1965), 이만희 감독의 《만추》(1966), 최하원 감독의 《독짓는 늙은이》(1969) 등이 있다.[43] 또한 정소영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번》(1968)은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 산업의 전성기는 1968년부터 점차 퇴조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대중오락의 다변화로 인해 영화가 누리던 절대적인 인기가 점차 사그라들었기 때문이다.[43]
2. 5. 1970~1980년대: 불황과 새로운 모색
1970년대에 들어 한국 영화계는 텔레비전 보급과 레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다시 불황을 맞이했다. 영세한 제작 환경, 협소한 시장, 부족한 제작 시간과 비용, 자본주인 흥행사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의욕적인 작품 제작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침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71년 2월 영화진흥조합을 발족시켜 국산 영화(방화) 제작비 융자, 시나리오 창작금 지원, 영화인 복지 사업 등을 추진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1974년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 1977년 김호선 감독의 《겨울여자》 등이 흥행에 성공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특히 이장호, 김호선, 하길종 등 새로운 감각을 지닌 젊은 감독들의 등장은 70년대 한국 영화계에 세대교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별들의 고향》은 서울 국도극장에서만 4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44], 1975년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는 36만 명, 같은 해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은 당시 대학생들의 연애와 방황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국 영화 수입 할당제가 오히려 수입권 확보 경쟁을 심화시켜, 70년대 중반부터 한국 영화는 점진적인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반에도 텔레비전 보급과 레저 산업 성장으로 영화의 대중 오락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며 영화 산업의 사양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불황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제반 여건 미비로 한국 영화가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소규모 기업 수준에 머무른 내적인 문제에 있었다.[44] 1986년 영화법 개정 이후 영화 제작이 자유화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한 해 제작 편수가 106편에 달하며 80년대 들어 최다 제작 편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작 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화 직배 문제로 수입 영화 물량이 폭증하면서 국산 영화는 흥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관객들의 외화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외화는 국산 영화보다 훨씬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44] 이 시기 이장호 감독 등은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의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부조리나 비인간적인 조건을 묘사하며 주목받았다. 이러한 경향은 분단과 독재 등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1988년 UIP가 미국 영화 《위험한 정사》를 직접 배급하면서 한국 영화계는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영화인들은 영화법 개정 요구와 함께 UIP 직배 저지 투쟁을 전개하며 심기일전을 꾀했으나, 일부 영화인의 사욕으로 인한 내분이 발생하며 영화계 내부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객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그 틈을 타 미국 직배 영화는 전국의 영화관을 빠르게 장악했다. 특히 서울 서울시네마타운에서 개봉한 《사랑과 영혼》은 사대문 안 개봉관에 입성한 첫 직배 영화로, 당시 한국 영화인들이 국내 영화 산업의 종말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 6. 1990년대: 한국 영화의 부활
1990년에는 소시민의 삶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린 장선우 감독의 《우묵배미의 사랑》과 신승수 감독의 《수탉》, 눈먼 소녀와 어린 남매의 시각으로 잃어버린 고향과 휴머니즘의 말살을 고발한 서정적인 박철수 감독의 《오세암》, 전과자의 일생을 꾸밈없이 그린 이두용 감독의 《청송으로 가는 길》 등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특히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은 1990년대 초에도 두드러졌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여러 모순과 부조리,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영화를 통해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박광수 감독의 《그들도 우리처럼》은 1980년대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을 탄광촌을 배경으로 그려냈으며, 김유진 감독의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보수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영화들은 한국의 분단 현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등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침체되었던 한국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은 당시 한국 영화 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하는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영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은 오랫동안 금기시되었던 분단 이데올로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큰 주목을 받았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북한에서 탈출한 신상옥 감독이 남한에서 처음 만든 대작 영화 《마유미》 역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코리안 커넥션》, 《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미친 사랑의 노래》, 《물위를 걷는 여자》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또한, 독립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부활의 노래》나 노동 운동을 다룬 비제도권 영화 《파업전야》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시도들이 199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2. 7. 2000년대~현재: K-무비의 세계화
2000년대 이후에도 한국 영화는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특징을 이어갔다. 영화들은 종종 한국 사회가 겪어온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문제들을 중요한 소재로 다루었다.임권택 감독의 2002년 영화 취화선은 조선 시대 말기 화가 장승업의 삶을 통해, 대만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후기 식민 영화사 서술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역사적 외상을 현대적 형태로 나타내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는 과거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승화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현대 한국 사회의 심화된 자본주의와 그로 인한 빈부격차, 계층 간의 갈등 및 기존 사회 질서와의 싸움을 날카롭게 묘사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주요 부문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 역시,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당시 한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깊은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5년 ~ 현재)
북한 영화의 기원은 1947년 2월 6일 출범한 '국립영화촬영소'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은 주로 체제 선전과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1985년에는 괴수 영화인 《불가사리》가 개봉되었다.3. 평가
한국 영화는 그 시작부터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영화는 근대 사회의 산물이지만, 한국은 영화 발전을 뒷받침할 만한 사회적 여건이 매우 미숙한 상태에서 영화를 받아들였다.[45]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술적, 자본적 한계는 더욱 두드러졌다. 초기 영화 제작은 연극과 영화를 섞은 연쇄극 형태인 《의리적 구토》(1919)에서 시작하여, 완전한 극영화 형태인 《월하의 맹서》(1923) 등으로 점차 발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성 영화였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하고 등장인물의 대사를 대신하는 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때로는 영화의 성공 여부가 변사의 능력에 좌우될 정도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초기 영화인들의 의욕은 왕성했다. 특히 나운규와 같은 창의적인 영화인의 등장은 주목할 만하다.[45] 나운규는 감독, 배우, 시나리오 작가를 겸하며 한국 영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대표작 《아리랑》(1926)은 단순한 전설의 영화화를 넘어, 일제강점기하 민족의 슬픔과 저항 정신을 담아내며 전국적인 공감을 얻었다. 이 작품은 영화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족의 고뇌를 표현하는 강력한 매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42] 《아리랑》의 성공은 한국 영화계에 큰 자극을 주어 이후 많은 영화인이 제작에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초기 한국 영화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는다.[42][45] 영화인들은 예술적 완성도 추구보다는 민족의 고뇌와 분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 영화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42] 특히 일제의 검열과 탄압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졌다. 변사는 때때로 검열을 피해 민족적 메시지나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22][36], 유성 영화의 등장은 이러한 역할을 어렵게 만들었다.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에는 일본의 통제가 더욱 심해져, 일본 문화와 체제를 선전하는 영화 제작이 강요되기도 했다.[33][34][35]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영화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해방 직후 제작된 영화들은 주로 광복의 감격을 표현하고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명하며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만세》(1946)와 같은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전쟁으로 다시 한번 시련을 겪었지만, 영화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예술적 진전은 196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42] 1955년 국산 영화 면세 조치[43], 최신 장비를 갖춘 촬영소 건립 등 제작 환경이 개선되면서 한국 영화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김기영 감독의 《하녀》,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과 같이 사회 현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독창적인 미학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등장하며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엄격한 검열과 영화 산업 통제로 인해 침체기를 겪었지만, 이장호, 김호선, 하길종과 같은 젊은 감독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들은 《별들의 고향》(1974), 《영자의 전성시대》(1975), 《바보들의 행진》(1975) 등의 작품을 통해 당대 젊은이들의 좌절과 방황, 사회 부조리를 감각적으로 그려내며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에는 이장호 감독을 중심으로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의 영화들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모순과 민중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한국 영화는 시작부터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현실과 깊은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왔다. 열악한 환경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도 시대의 아픔을 기록하고 사회를 비판하며 민족의 정서를 대변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조
[1]
웹사이트
Future Korean Filmmakers Visit UCLA
https://web.archive.[...]
2007-11-18
[2]
뉴스
U.S. Films Troubled by New Sabotage in South Korea Theater
https://www.latimes.[...]
1989-06-19
[3]
웹사이트
The Rise of the South Korean Film Industry
https://www.statista[...]
2020-02-11
[4]
뉴스
Korean K-dramas and Hallyu films are #Alive and well, but Bollywood hits rock Bellbottom amid coronavirus slump
https://www.scmp.com[...]
2020-08-05
[5]
웹사이트
Korean Film History and 'Chihwaseon'
https://web.archive.[...]
Korean Film Council
2008-02-17
[6]
뉴스
(49) Motion picture first came to Korea at turn of 20th century
https://web.archive.[...]
2010-12-12
[7]
서적
Im Kwon-Taek: The Making of a Korean National Cinema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8]
웹사이트
Recovering the past: rare films screened in Korea
https://web.archive.[...]
LA Trobe University
1998-12-18
[9]
웹사이트
"한국 최초의 영화관 '애관극장' 사라지면 안되잖아요"
https://www.hani.co.[...]
2021-11-02
[10]
웹사이트
Centennial of Korean cinema - From humble beginnings to mega hits
https://www.koreatim[...]
2019-10-13
[11]
웹사이트
Century of Korean film: 100 years after first local movie, industry makes history on global stage
https://koreajoongan[...]
2020-02-20
[12]
웹사이트
Korean cinema celebrates 100th year anniversary
https://www.koreatim[...]
2019-07-03
[13]
웹사이트
S. Korean movie industry to celebrate centennial in Oct.
https://en.yna.co.kr[...]
2019-04-17
[14]
서적
Korean Dance, Theater & Cinema
Si-sa-yong-o-sa Publishers
[15]
웹사이트
A Short History of Korean Film
http://www.koreanfil[...]
[16]
웹사이트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Cinema Under Colonialism: The History of Early Korean Cinema
https://web.archive.[...]
LA Trobe University
[17]
웹사이트
In the Land of Morning Calm
http://archive.org/d[...]
1925
[18]
웹사이트
노르베르트 베버 필름 컬렉션
https://www.koreafil[...]
[19]
웹사이트
독일인 신부가 수집한 겸재화첩, 50억 거절하고 한국 오기까지
https://www.hankooki[...]
2021-01-30
[20]
웹사이트
Newly discovered films shed light on Korean life under Japanese rule
http://kpopherald.ko[...]
[21]
웹사이트
Books Map Out Korean Film History
https://web.archive.[...]
[22]
서적
[23]
간행물
How the Byeonsa Stole the Show: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Silent Film Narrators
[24]
잡지
Classifying Performances: The Art of Korean Film Narrators
https://web.archive.[...]
2005-03
[25]
서적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Motion Picture Promotion Corporation
[26]
서적
Korea's Occupied Cinemas, 1893–1948: The Untold History of the Film Industry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12
[27]
IMDb
[28]
웹사이트
영화(MOVIE-Motionpicture)이야기
https://web.archive.[...]
[29]
간행물
Dirt, Noise, and Naughtiness: Cinema and the Working Class During Korea's Silent Film Era
[30]
서적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Motion Picture Promotion Corporation
[31]
서적
Korean Film : History, Resistance, and Democratic Imagination
Praeger Publishers
[32]
웹사이트
The story of Chun-hyang (Chunhyangjeon )
https://web.archive.[...]
[33]
서적
The Attractive Empire: Transnational Film Culture in Imperial Japan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Hawai'i Press
[34]
논문
The Korean "Cinema of Assimi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Hegemony in the Final Years of Japanese Rule
[35]
서적
Japanese Cinema and Otherness
[36]
서적
The Attractive Empire
[37]
서적
The Attractive Empire
[38]
서적
The Attractive Empire
[39]
저널
2015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http://www.kofic.or.[...]
2016-06-25
[40]
뉴스
[플래시백 한국영화 100년] 단성사 박승필 5,000원이 뿌린 한국영화의 씨앗
https://m.hankookilb[...]
한국일보
2019-03-02
[41]
웹사이트
보관된 사본
https://www.mk.co.kr[...]
2022-03-25
[42]
백과사전
한국의 영화
글로벌 세계 대백과
[43]
백과사전
한국영화의 역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
[44]
백과사전
영화산업의 현상
글로벌 세계 대백과
[45]
백과사전
한국의 영화
글로벌 세계 대백과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위기의 한국 영화 심폐 소생한다…내년 영화 예산 80.8% 증액
“한국 영화 심폐 소생 필요”…문체부 내년 영화 예산 80%↑
‘케데헌’만 있나…미국 자본 들어간 K콘텐츠 봇물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오스카 노린다…한국 대표로 아카데미 출품
박찬욱 '어쩔수가없다', 한국 대표로 내년 아카데미 출품
신예 전현지, 韓배우 최초 인도영화 '베다비야스' 캐스팅 "영광"
박찬욱 시선으로 담은 보통의 캐릭터…배우들이 귀띔한 '어쩔수가없다'
청불 '살인자 리포트' 9월 개봉작 韓영화 예매율 1위
'이번 영화제 최고 영화' 찬사…박찬욱 "극장서 봐주시길"
박찬욱 ‘어쩔수가없다’에 어쩔 수 없이 홀린 베네치아
박찬욱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지 느끼길”
박찬욱에 이병헌까지 총출동…베니스영화제 달군 '어쩔수가없다'
"매혹적 블랙코미디" 베일벗은 '어쩔수가없다' 베니스 첫 반응
'미지의 서울' 박보영, 백델리안 시리즈 부문 배우상 "주체적 캐릭터에 끌려"
“정훈이 덕분에 다 모였구나~” [.txt]
'살인자리포트' 정성일 "미친 대사량, 감독 죽이고 싶었다"
'살인자리포트' 조여정 "연기 못하면 숨을 곳 없어, 피하고 싶었지만 도전"
윤여정, 할리우드 신작 '결혼 피로연' 9월 24일 개봉…K-할머니 변신
할인권 배포 효과 봤다…7월 영화관 매출액·관객수 연중 최고치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